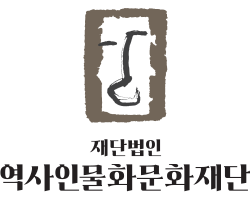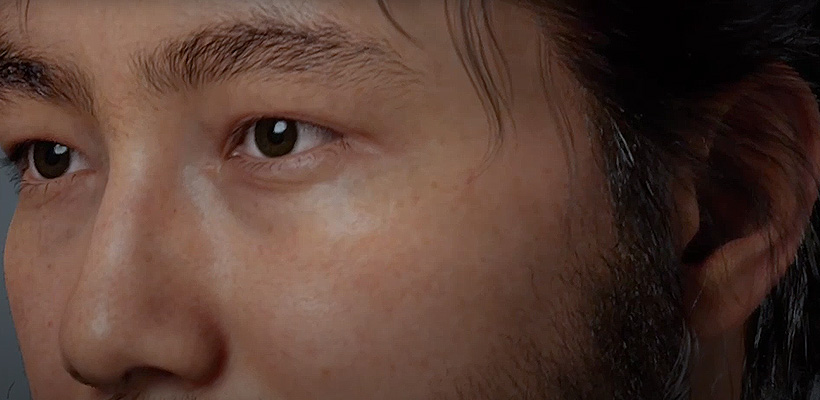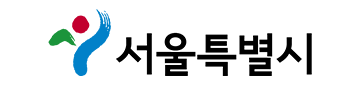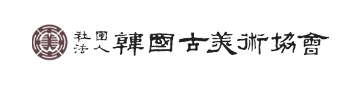한국의 전통 인물화
“The Shadow of Eternity; 영원의 그림자”
서양의 인물화, 특히 초상화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동안 언제나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초상화의 소재가 된 인물의 외적 형태를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묘사해 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헤겔이 『미학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 인물의 내면적, 정신적 특징 또한 초상화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화가 참된 예술작품이 되려면 […] 그 안에 개인의 정신적 통일성<즉, 육체와 영혼이 일치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하며 <그중에서도> 정신적 특성이 지배적이고 두드러진 것이어야 한다.”(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I, Werke in 20 Bänden Band 15,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89, p. 102)
얼핏 보기에 한국의 전통 초상화도 이러한 목적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터럭 하나라도 똑같이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외관을 그대로 묘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묘사의 대상이 된 인물의 됨됨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서양의 인물화와 마찬가지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그리는 영정(影幀)의 경우 그 사람의 고매한 영혼(그림자)이 그림 안에 담기도록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소재가 된 인물의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지성까지도 모두 담아내야 하기에 화가가 그의 사상을 연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체화해야만 제대로 영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탄생한 훌륭한 영정 작품들은 소재가 된 인물의 전인격이 그 안에서 우러나와 벤야민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위대한 예술작품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 그린 임금의 영정인 어진(御眞)이 불타 소실되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소복을 입은 채 3일 동안 곡을 하고 슬퍼하였을 정도다. 이런 의미에서 영정에는 -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말한 것처럼 - 존재자의 진리가 그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공통점 이면에 있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먹을 머금은 붓으로 한지나 비단에 그리는 수묵담채화이다 보니 유화 중심의 서양 인물화와는 다르게 선이나 색채, 음영 등이 부드럽고 깊이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화면 뒤쪽에도 붓으로 채색하는 배채법(背彩法)을 사용함으로써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서양 인물화의 경우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적 특징이 대부분 권력이나 위엄 등 보는 사람에게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며 심지어 부를 과시하는 측면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전통 인물화는 유‧불‧선 삼교에서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를 체화한 고매한 인격이 그림에서 배어 나오도록 그렸다.
한국전통인물화 영상Ⅰ
한국전통인물화 영상 Ⅱ